[오승직의 음악칼럼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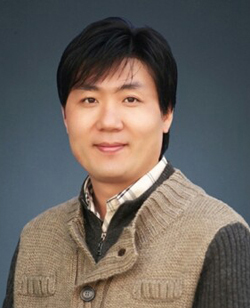
이 이야기는 88년도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해의 일이다.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다급하게 나를 찾는 손님이 동아리방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 주었다. 마침 공강이 3시간이나 있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둘러 동아리 방으로 갔다. 가서 만난 사람들은 지금 기억으론 서너 명인 것 같은데 처음 보는, 전혀 모르는 건장한 남자들이었다. 한 사람은 양복을 입은 미남형 스타일이고, 한 사람은 완전 험상궂은 무서운 인상이었다. 한두 명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는다.
순간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잠시 긴장했는데 그들 중 누군가의 ‘부탁할 게 있어서 어제도 왔었는데, 없어서 다시 오늘 왔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나니 속으로 휴~ 하며 괜히 마음이 놓였다. 오히려 갑자기 무슨 일인지 호기심이 발동해서 ‘무슨 일입니까?’라고 물었더니 ‘혹시 트럼펫 갖고 있습니까?’라는 되물음으로 돌아왔다.
속으로 ‘아니, 어떻게 내가 트럼펫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라는 불안한 생각이 들어 조금 긴장되었다. 왜냐하면 당시 트럼펫이 흔히 볼 수 있는 악기가 아니었고 그 악기에 대해 말하는 그 사람들 모습이 예사로워 보이진 않았기 때문이었다. 일단 ‘네’라고 대답을 하니 그거 잠깐 빌릴 수 있습니까? 라고 바로 치고 들어왔다. 그런데 그때는 트럼펫을 시골집에 놓고 와서 학교에는 없었다. 그래서 안될 것 같다고 거절했더니 갑자기 그 사람들 얼굴에 무거운 근심이 내려앉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졌다. 그런 어색한 상황에서 그 미남형인 사람이 가지러 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다소 어이없는 제안을 하였다.
그 당시는 우리 시골집에 가려면 버스를 세 번 갈아타야 했다. 공강 시간이 3시간이라도 강의 시간에 맞춰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이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무서운 사람이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간곡히 다시 부탁하였다.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다소 난감해하는 표정이었지만 정말 절실했는지 말해 주었다.
며칠 있으면 어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을 위해 트럼펫 연주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근데 당시 제주도 악기사에서는 바로 살 수가 없었고 주문을 해야 하는데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장담을 못 하기에 주변에 수소문해서 나를 찾아왔다고 했다. 그제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찾아왔는지 알 수 있었다.
그 당시 필자는 음악을 전공하기 전이라 ‘경음악’이라고 불리는 연주 음악을 많이 듣는 편이었다. 그중에서 ‘게로르그 장피르’의 ‘외로운 양치기’를 종종 듣곤 했었다. 그 곡은 팬플릇으로 유명한 곡인데 나는 그 악기보단 중간에 나오는 트럼펫 소리가 너무 멋있게 느껴졌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전 재산을 다 털어 트럼펫을 샀다. 황금색의 트럼펫이었는데 재산 목록 1호였다. 주중엔 학교 옥상에서, 주말엔 우리 동네 바닷가에서 매일 연습했는데 뭐가 뭔지 모르니 도통 늘지 않았다. 그렇다고 딱히 어디 가서 배울 데도 없었다.
그러다 동아리 선배 중 음대에서 바순을 전공하는 예비역 선배한테 트럼펫 전공생 한 명만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주도 최고의 트럼페터라며 한 형을 소개해 주었다. 그 형은 레슨비도 받지 않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레슨을 해 주었다. 레슨이 없을 때면 그 형은 옥상에서 트럼펫을 불었고 그러면 옥상에서 바람을 쐬던 학생들이 주변으로 모여들어 아름다운 트럼펫 연주를 듣곤 했다.
이 추억이 가슴에 아리는 이유는 그 형과는 그 이후 친형제 이상으로 가깝게 지냈는데 육지에서 음악 교사로 생활하다 가정을 이뤄 행복하게 지내던 중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그게 벌써 20여 년 전 일이다. 어쨌든, 그래서 누군가가 학생회관 옥상에서 들리는 트럼펫 소리를 듣고 알려 준 것 같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