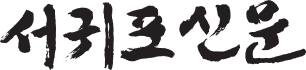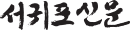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자리 잡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는 1996년 8월 1일 제주도 승격 50주년 기념식에서 당시 신구범 지사의 '제주도민의 자존을 건 컨벤션센터 건립' 제안으로 출발했다. 당시 도민들에게는 컨벤션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게 다가오던 때였다.
컨벤션센터 건립은 아시아태평양 정상회의(ASEM) 유치 실패가 기폭제가 됐다. ASEM은 아시아.태평양 25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회의로 96년 태국에서 1차회의가 열렸으며 2000년 3차회의가 한국에서 개최키로 예정돼 있었다. 한국에서는 서울과 부산.제주가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서울로 개최지가 결정됐다.
제주가 ASEM 유치에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컨벤션 시설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제 자극 받은 도정은 도민주 공모 등으로 예산을 확보, 컨벤션 건립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추진과정에서 도지사의 바뀜 등으로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2003년 3월 공식 개관하게 된다. 이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제주도 회의산업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성장했다. 한.미정상회의, 미.소정상회의, 한.중.일 정상회의를 비롯 각종 대형 국제 회의를 유치하면서 제주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
물론 컨벤션센터의 만성적인 적자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컨벤션이 수익시설이나 기반시설이냐 하는 논쟁은 물론 있다. 하지만 이는 컨벤션의 역할을 간과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 판단된다. 컨벤션은 당연히 제주의 관광인프라로 인식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컨벤션센터의 전시시설 확충을 놓고 논란이 많다. '과도하다, 다른 시설과 중복된다'는 등 다양한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일면 타당한 지적이다. 하지만 제주컨벤션센터가 제주의 관광인프라로서 더 많은 역할을 하려면 전시기능 보강은 시급한 발등의 불이다.
한국산업진흥회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국내에서는 모두 569건의 전시회가 열렸다. 2000년 132건에 비해 4~5배 성장한 규모다. 회의산업이 중심이 이제는 단순회의에서 벗어나 전시.회의로 추세가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실 그동안 업계 안팎에서는 전시산업이 기업회의, 포상관광,국제회의 등 MICE의 다른 영역에 비해 저평가 받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이처럼 세계적인 추세가 전시회의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로 시설되는 컨벤션센터에는 전시기능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기존의 컨벤션들도 회의시설 확충을 서두르고 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따르면 2000년 서울 코엑스(COEX)가 15271㎡를 확장한 것을 비롯해 2011년 일산 킨텍스(KINTEX)와 대구 엑스코(EXCO)가 각각 5만4591㎡, 1만543㎡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했다. 2012년에는 부산 벤스코가 1만9872㎡를, 2013년에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er)가 2955㎡를 넓혔다. 또 인천 송도 컨벤시아도 대규모 시설확충에 나서고 있다.
리조트형 전시컨벤션도 선보이고 있다. 전시.회의.휴양을 겸하는 국제회의 추세를 선도하고 있는 것이다. 베네시안 마카오(전시장 면적 7만4682㎡·회의장 면적 1만5223㎡)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전시장 면적 3만3538㎡·회의장 면적 3만4196㎡) 등이 그런 예이다. 2018년을 완공목표 하는 제주 신화역사공원내 리조트월드에도 이런 휴양형 컨벤션이 선보일 예정이다.
제주도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이런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전시시설 보강을 위해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도의회에서 뭉그적거리고 있다. 그러나 전시기능 보강은 이렇게 시간을 끌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컨벤션센터 건립은 '제주의 자존'에서 시작됐다. 이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수많은 국제회의를 유치했으며,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제주를 찾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전시기능이 보강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의 관광인프라로서 제 기능할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적자문제 등 운영에 대한 비판은 그 이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