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직 음악칼럼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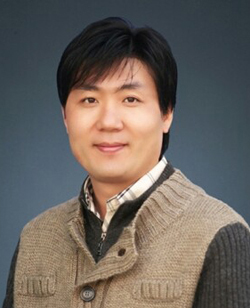
필자가 국립합창단을 서귀포에서 처음 만난 지는 지금부터 약 30여 년 전이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전국 순회공연 차 들렀던 것 같다. 서귀포 시민회관에서 연주를 하였는데 지금도 당시 들었던 Malotte ‘주기도문’의 환상적인 화음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의 나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준 사건이기도 하다.
지난 토요일 필자는 서귀포 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한 국립합창단 연주를 관람하였다. 지인이 초대권을 예약했다기에 큰 기대는 하지 않고 마지 못해 가기는 했다. 왜냐하면 그간 국립합창단 연주를 많이 관람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의 전문 합창단들의 소리나 레파토리 등은 각각의 고유한 특성이나 색깔이 없이 대부분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려웠다. 오히려 마음 한켠엔 ‘제발 시간 낭비만 아니길’을 빌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점도 있었다. 현재 국립합창단 지휘자는 필자가 제주합창단 재직 시 미국에서 갓 귀국하여 초보 지휘자로 객원지휘를 했었기에 그때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싶은 호기심이 있기는 했다.
첫 무대는 한국 합창곡으로 4곡 모두 무반주로 연주하였다. 국립합창단이라는 기대에 어울리게 4성부의 좋은 균형과 조화를 이뤄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섬세함과 강약의 조화로움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두 번째 무대는 영화음악으로 꾸며졌는데 부드럽고 편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솔로이스트들이 마이크를 씀으로써 합창 소리와의 이질감과 음량의 균형이 무너지는 아쉬움이 있었다. 굳이 마이크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자들인데..
세 번째 무대는 오페라 합창 무대였다. 항상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친숙한 곡들이 선곡되어 시원한 분위기를 선사했다.
마지막 무대는 ‘Viva Classic’이라는 타이틀로 귀에 익은 클래식 선율을 메들리 합창으로 편곡한 곡이었다. 자칫 무겁게 느껴질 클래식 음악을 가볍고 재미있게 연주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앵콜곡 아리랑을 마지막으로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기립 박수와 환호로 감동적인 연주는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한가지 크게 아쉬운 점이 있었다. 연주 시작부터 앞자리의 어린이들이 떠들고 움직이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 시작했다. 한 가족인 것 같았는데 감상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몇 번 주의를 시켰지만, 변화가 없었다. 그 앞의 외국인 관람객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는지 맨 앞의 비어있는 자리로 이동하고야 말았다. 결국 엄마로 보이는 분이 어린이 한 명을 아빠와 함께 내보냈는데 그제야 비로소 진정되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시간이 흐른 뒤라 불쾌감은 없어지지 않았다.
서귀포예술의 전당은 제주도에선 가장 훌륭한 기획력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다. 제주시에서도 많은 관객이 찾아오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한 대책은 속히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립합창단은 올해 창단 50주년을 맞았다고 한다. 그간 우리나라 민요를 합창으로 대중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어려운 시절 국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고 수준 높은 연주로 우리 합창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앞으로도 국립합창단만의 선 굵은 특성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누가 뭐라 해도 국립은 국립이니까!
오승직 지휘자/음악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