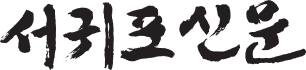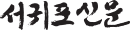오충윤 / 에밀 타케 생태영성연구소 대표

제주도는 흔히 ‘식물의 보고(寶庫)’라 불린다.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기에 고유한 식물 종들이 잘 보존되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자생하는 관속식물 4300여 종 가운데 무려 46% 상당인 2000여 종이 제주에 깃들어 살아간다.
국토 면적의 1%도 안 되는 작은 섬에 절반 가까운 식물이 자라니, 제주야말로 설화에 나오는 설문대 할망이 특별히 손길을 베푸신 땅이라 할 만하다. 그 중심에는 우뚝 솟은 한라산이 있다. 한라산은 높이에 따라 아열대 식물에서부터 한대성 고산식물까지 층층이 살아 숨 쉬는 거대한 생명의 기록관이다.
시인 정지용(鄭芝溶, 1902~1950)은 1941년 제주를 방문해 한라산을 오르며 만난 식물들을 시로 남겼다. 그의 시 ‘백록담’에는 무려 열일곱 종의 제주 식물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도 다양하다. ‘뻑국채, 암고란, 백화, 도체비꽃, 풍란 … 물푸레, 동백, 측넝츨, 떡갈나무… 고비고사리, 도라지꽃, 취, 삭갓나물, 대풀, 석이…’
짧은 시구마다 한라의 숲과 곶자왈들이 생생하게 살아난다.
이렇게 일제강점기 어두운 시절에도 제주의 식물은 시인의 언어가 되어 노래하며 위로를 건네고 있었다.
20세기 초 유럽인들이 제주도를 ‘식물의 낙원’이라 부른 데는 프랑스 선교사 에밀 타케(Emile Taquet, 1873~1952) 신부의 공헌이 크다.
그는 1902년부터 13년 동안 서귀포 홍로성당에서 사목하며,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던 식물 채집을 통해 생태 영성의 삶을 살았던 사제이자 식물학자였다. 에밀 타케가 채집한 만여 점이 넘는 표본들은 유럽의 대학 연구소와 식물원 등으로 보내졌고, 그 덕분에 왕벚나무 자생지 발견을 비롯해 제주 특산 식물의 소중한 가치가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된다.
특히 그가 한라산에서 처음 채집한 구상나무는 아름다운 수형과 은은한 피톤치드(phytoncide)향으로 인기를 끌어 유럽의 정원에 심어졌으며, 훗날 크리스마스 트리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지난 가을 서홍동 옛 홍로성당 터 ‘면형의 집’에서 열린 ‘에밀 타케 식물표본전시회’를 찾았을 때 나는 깊은 울림을 받았다.
오래된 종이 위에 눌려 있는 작은 잎과 꽃, 그리고 앙상한 줄기들이 마치 10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우리는 여전히 살아 있다”라고 속삭이듯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식물 표본은 단순히 말려진 종이가 아니라,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생명의 흔적임을 새삼 깨닫게 해 주었다.
이러한 식물 표본들은 단순한 학술 자료를 넘어, 에밀 타케의 생태 영성을 우리 시대에 전해주는 매개체였던 것 같다. 동시에 오래전 어린 시절에 여름방학 숙제로 식물을 채집해 신문지에 눌러 놓았다가 색종이에 붙여 보았던 추억이 떠올랐다.
그 후 나는 식물 표본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전문가를 찾아 채집법을 배웠고, 첫 표본으로 눈 덮인 서귀포치유의숲에서 겨울딸기를 채집할 수 있었다.
봄에 익는다고 알려진 딸기가 차가운 바람 하얀 눈 속에서 붉게 빛나는 모습은 놀라웠다. 100년 전, 타케 신부의 편지에도 등장하는 그 겨울딸기를 뿌리째 조심스레 채집하면서 느꼈던 설렘은 아직도 생생하다.
겨울 숲속에서 어렵게 채집하고 한 달여 동안 압착과 건조 과정을 거쳐 완성된 표본을 손에 들었을 때, 한 장의 작은 종이 위에는 계절과 생명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후 위미리 과수원의 ‘뽀리뱅이’, 보목 바닷가에서 만난 ‘감국’, 정모시 공원의 노란 무궁화 ‘황근’ 등을 채집하면서 식물과 조금 더 가까워졌다. 어찌 보면 식물 표본 작업은 단순한 연구의 도구가 아니라, 한 생명이 걸어온 시간을 기록하고 그 생명의 이야기를 후대에 전하는 아카이브(archive)라 할 수 있다.
비록 한 장의 표본은 작은 종이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빛과 바람, 땅과 물이 고스란히 눌려 있다.
그것은 생명의 신비를 기억하게 하는 책갈피이기도 하다.
태초에 살아있는 생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식물이었으며, 그들은 인간보다 앞서 세상에 숨을 불어 넣어 주었다. 그럼에도 인간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환경을 훼손해 왔지만 식물은 자신을 내어주며 생태계를 회복시킨다. 우리는 그 겸손한 생명 앞에서 창조의 질서와 기후 환경 보전을 배워야 한다. 인간이 식물을 사랑하고 다양성을 지켜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의 풍요로움을 유지해 주는 감사와 응답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없어도 식물은 살지만, 식물이 죽으면 인간도 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