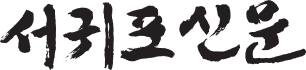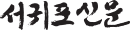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이 최근 위기를 맞고 있다. 한미 FTA 협정체결에 이어 한중 FTA 협정이 이뤄진다면, 값싼 외국산 감귤류가 밀어닥쳐 제주산 감귤에 치명적 위협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기후온난화 여파로 노지감귤 재배면적이 갈수록 타 지역으로 북상하면서 경쟁력 약화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여건변화는 감귤산업이 더 이상 제주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다.
노지감귤 외에도 감귤 만감류에도 새로운 도전세력이 등장하고 있다. 타 지역 농가와 농기센터 등에서 감귤 만감류 시설재배에 눈을 돌리며 비약적인 기술발전을 일궈내고 있다. 그동안 제주에서만 재배되던 한라봉, 레드향 등 만감류가 5년 전부터 전남, 전북에 이어 심지어 중부권역의 충북 충주에서도 본격 생산되고 있는 것.
본지가 5회에 걸쳐 기획 연재한 사례를 보면, 타 지역 만감류 재배가 도내 농가에 새로운 경쟁요인이 될 것이란 사실을 충분히 시사하고 있다.
노지감귤에 이어 만감류에서도 제주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게 된다면 이는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서귀포시 농가에 비상이 아닐 수 없다. 비록 타 지역에서의 만감류 생산량이 제주에 비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품질면에서는 오히려 제주산을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후조건은 다소 불리하지만, 일조량과 일교차 등 재배여건이 양호하고 물류비 절감효과도 높은 편이라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제주의 생명산인 감귤산업이 국내외의 거세 도전을 물리치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려면 더욱 신발 끈을 단단히 조여매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만감류의 경우 그간의 안이한 자세에서 벗어나, 타 지역의 앞선 기술을 습득하려는 도내 농가의 겸허한 자세가 요구된다. 한미 FTA협정 이후 미국산 오렌지 수입 증가와 맞물려, 타 지역과 기술제휴를 통한 상생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주산 감귤류를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는 방안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영광굴비나 부여 굿뜨래 등 국내의 유명 브랜드 사례에서 보듯, 제주산 감귤류에 대해 유명 브랜드 육성방안이 있어야 소비자들의 높은 인지도를 토대로 탄탄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무한 경쟁시대를 맞은 지금, 제주의 감귤산업이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행정과 농가가 하나가 돼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가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