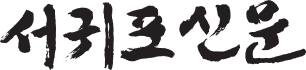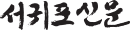[신간] 한기팔 시인의 『겨울 삽화』(황금알)

한기팔 시인이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10번째 시집을 냈다. 『겨울 삽화』(황금알)인데, 시인이 평생 천착했던 서정시, 그 가운데도 고향 서귀포의 자연을 노래하는 시어가 돋보인다.
한 시인은 시인의 말에서 ‘비! 알몸으로 풀꽃 하나 봉우리를 맺지 못하는 자갈밭이 젖고 있다. 귀갓길에서 만난 늙은 농부가 갈다 남은 자드락밭이 젖고 있다’고 했다.
기계 영농이 일반화된 시대에 몸으로 밭을 갈 농부가 어디 있으랴? 시인이 만났다는 늙은 농부는 시인 자신일 테니, 예술적 성취를 미처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자드락밭(비탈밭)이라 했을 것이다.
시집은 총 5부, 66개 작품으로 구성됐다. 고향과 고향의 자연, 흐르는 시간에 대한 관조 등이 전체를 관통한다.
별똥별 하나/ 하늘 멀리/ 날아가니/ 그곳이 나의 고향이다. -작품 ‘고향’의 3연
시인은 평생 보목마을 섭섬을 바라보며 살았고, 평생을 서귀포를 노래했다. 그런데 멀리 보이는 별이 전생의 자신의 모습이라고, 별똥별이 떨어진 그곳이 자신이 고향이라고 노래한다. 이생의 고향을 떠나 전생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걸까?
소나기 그치자/ 어디선가/ 왁자지껄/ 웃음소리 들리나 싶어/ 돌아보니
거기 능소화/ 환히 피어/ 만식이 새댁/ 부엌문 열고/ 내다보네.- ‘능소화’ 3연과 4연
초여름 소나기가 잦게 내릴 무렵 분홍빛 능소화가 활짝 피어 담장을 덮었다. 한껏 피어난 능소화를 바라보는 새댁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다. 생각만 해도 정겨운 시골의 여름 풍경이다.
애제자를 칭송하는 시도 있다.
오승철 시인은/ 쇠고기는 못 먹는다고 했다./ 아니, 안 먹는다고 했다
그 선한 눈/ 시의 들판에서/ 그가/ 진정 소이기 때문이다
아니, 쇠테우리이기 때문이다. -'윗세오름 산장에서' 전문
시인이 아끼는 제자는 선한 눈으로 서귀포의 자연을 바라보고 시를 지었다. 평생을 시를 붙들고 시에 의지에 살았는데, 지금은 병마와 씨름하고 있다. 그 제자에게 ‘쇠테우리’라는 최고의 찬사를 남겼다.
제주 해녀의 슬픈 운명을 헛무덤과 순비기 꽃으로 노래했다.
물질 갔다 죽어/ 찾다 못 하면
바닷가 볕바른 곳에/ 입던 옷 몇 가지 묻어/ 꽃이라면/ 순비기꽃 몇 포기 심어라
제주 해녀는 혼백상자 등에 지고 푸른 물속에 살아야 했던 운명이다. 물질을 하다 사고를 당했는데 시신을 찾지 못하는 일도 다반사. 평생을 고된 노동으로 보냈던 해녀를 위로할 게 순비기꽃 밖에 없다니.
시인은 1937년 서귀포시 보목동에서 태어나 1975년 박목월 시인의 추천으로 『심상』1월호에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50년 넘는 세월 동안 서귀포를 바라보며 언어로 그물을 짜고 집을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