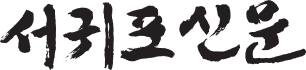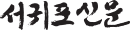道 1일, 덕수리마을회를 불무공예 보유단체로 인정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제주도 무형문화재 덕수리불미공예의 보유단체로 덕수리마을회를 인정ㆍ고시했다고 밝혔다.
덕수리불미공예는 불미(풀무)와 흙 거푸집을 이용해 무쇠로 솥이나 보습과 같은 생활필수품이나 농기구를 만드는 제주 전통 기술이다. 불미는 풀무의 제주방언으로, 불에 바람을 일으켜서 쇠를 녹이는 기술을 일컫는다.
불미공예가 덕수리에 처름 들어온 것은 300년 전쯤의 일이다. 당시 전라도에서 쇠를 다루던 송세만(1699~1791) 씨가 덕수리에 들어오면서 시작됐다. 송세만 씨는 당시에 명도암과 낙천리 등 불미에 적합한 흙을 찾아 제주도 여러 마을을 누볐는데, 덕수리의 참흙에 끌려 정착했다. 덕수리 참흙은 점질이 세밀하고 열을 가할수록 단단해지는 특징이 있어 불미에는 적합하다.
덕수리 불미공예를 연구한 강명원 서귀포문화원장은 덕수리 불미공예가 삼국시대의 제철 방식인데, 국내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철기구를 생산하는 곳은 덕수리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철제기구를 만들려면 원대장과 뚝대장, 잿대장 알대장 등의 불미 조직체계가 필요했다. 그 가운데 원대장은 일종의 사업주로, 필요한 돈을 대는 사람이었다. 다른 기술자들은 제품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인건비는 보습이나 솥으로 받았다. 보수에는 기술별로 차등을 뒀다.
1960년대 후반까지도 덕수리는 불미공예로 호황을 누렸다. 덕수리의 옛 이름이 세당인데, 세당보습은 그야말로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 그런데 농가에 경운기가 보급되고 알루미늄 솥이 나오면서 불미공예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다.
덕수리불미공예는 당초 개인종목으로 지정됐으며, 2017년 윤문수 전(前)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됐다.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고령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전수교육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그간의 업적을 고려해 명예보유자로 인정한다. 이후 전승의 중심체인 보유자(보유단체)가 공석이 됐다.
불미공예가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지만 그동안 덕수리마을회가 전통 기술을 보전하는 일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덕수리는 1991년부터 매년 덕수리 전통민속 재현 행사를 열어 덕수리불미공예를 시연하고, 정기 전수교육, 불미공예를 활용한 ‘솥굽는 역시’ 공연 등 종목을 전승하고 알리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인해 단순히 쇠를 다루는 기술뿐만 아니라 노동의 과정에 수반되는 풀무질 노래도 고스란히 보전됐다.
제주자치도는2019년 불미공에를 단체종목으로 전환하고, 올해 덕수리마을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했다.
강명원 원장은 “불미공예가 국내에 유일하게 남은 문화인만큼, 편한 방식으로 가려 하지 말로 전통의 방식을 꾸준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며 “그래야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제주자치도는 덕수리마을회가 전승에 필요한 기량, 기반 등을 두루 갖췄고, 특히 전승에 참여하는 주된 구성원이 젊고 전승 의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