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직의 음악칼럼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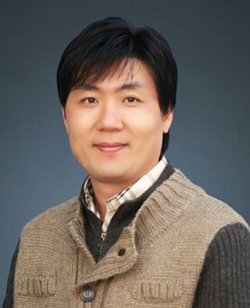
추운 겨울을 견딘 만물이 언제 그 고통이 있었느냐는 듯 힘찬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의 시계에 맞춰 다시 어김없이 새 기운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도 한겨울 켜켜이 껴입었던 두꺼운 옷들을 하나둘 벗어 던지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멋을 내기 시작합니다.
음악가들도 새봄엔 뭔가 멋을 내고 싶었는지 봄을 노래한 곡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곡인 비발디의 사계 중 ‘봄’은 단연 최고 인기작입니다. 거기에 조물주의 창조를 말하는 하이든의 ‘천지 창조’ 중의 ‘봄’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전 시립합창단 시절 꽤 많이 연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의 ‘봄의 왈츠’는 우리나라 대표 소프라노 ‘조수미’의 연주가 참 감칠맛 납니다. 멘델스존의 ‘봄의 왈츠’는 분명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곡입니다. 휴대전화기 벨 소리, 어떤 시그널 음악 등으로 우리 곁에 늘 붙어 있습니다. 원래 이 곡은 멘델스존의 ‘무언가’ 5권에 있는 6번째 곡입니다. 한번 검색해보면 아하! 이 곡! 모두 입꼬리가 올라갈 것입니다. 음악을 좀 안다는 분들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 곡의 내용을 알아보면 좀 섬뜩합니다. 봄의 신에게 순결한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내용의 발레 음악입니다.

우리나라로 눈을 돌리면 참! 정감 있는 노래들이 많습니다.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 피네’ 김동진의 ‘봄이 오면’은 학창 시절 한 번쯤 음악 시간에 불러 봤을 것입니다. 사실 이 곡은 작곡자가 ‘건넛마을 젊은 처자’의 악상이 갑자기 떠올라 순식간에 작곡된 곡이라고 합니다. ‘봄 처녀 제 오시네, 새 풀 옷을 입으셨네’ 홍난파의 ‘봄 처녀’입니다. 이 곡도 ‘봄이 오면’ 못지않게 학창 시절 음악 시간에 많이 불렀던 곡입니다. 또한, ‘푸른 잔디 풀 위로 봄바람은 불고’로 시작하는 현제명의 ‘나물 캐는 처녀’는 무반주 합창곡으로 연주했던 기억이 있는데 테너의 멋진 솔로와 콜로라투라 소프라노의 화려한 고음의 기교를 뽐내는 모습이 마치 새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듯합니다. ‘남촌’은 필자가 음악을 전공하기 전 음악 동아리에서 목이 쉴 정도로 많이 불렀던 곡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봄 하면 이 곡을 빼면 섭섭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인기 성악가 ‘엄정행’이 불러야만 제맛인 ‘목련화’는 예전 새봄맞이 가곡의 밤 단골 레퍼토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필자가 가장 멋들어진 노랫말이라고 생각하는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언덕 위에 백합 필 적에…’ 박태준의 ‘동무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첫 가곡인 이 곡은 3.1운동 길인 대구의 청라언덕을 배경으로 한 노랫말인데 작곡자의 애틋한 첫사랑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야기 한번 제대로 못 해 보았는데 그 여학생은 말없이 유학을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이렇듯 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하듯 음악가들도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키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봄을 노래한 노래들은 기분을 좋게 하고 희망을 품게 합니다. 봄을 노래하면 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봄을 노래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새봄에 지난겨울의 우울함과 무거움을 걷어내고 환하게 웃으며 노래해 봅시다. 마음이 가볍고 기분이 좋아서 노래하기도 하지만 노래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봄은 희망의 계절입니다. 많은 작곡가가 봄을 노래하며 사랑과 희망을 품었듯 우리도 새 기운으로 노래합시다. 아름답고 희망찬 봄의 교향악을.
오승직 지휘자 음악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