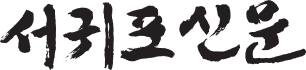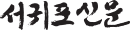김은경 / 서귀포시 일본교류 담당

#8 한국의 풍성한 ‘한상차림’ vs 일본의 절제된 ‘이치주산사이’
“일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소식(小食)을 할까? 그렇게 먹고도 힘이 날까?”
이 질문을 종종 듣는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밥상 문화가 일상에서 어떻게 다르고 닮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오랜 역사와 문화를 교류해왔지만, 식탁 앞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한상 차림’은 한 그릇의 밥, 뜨거운 국, 다양한 반찬이 한 상에 펼쳐진다. 나물, 김치, 무침, 각종 구이와 찜, 전과 조림까지 어우러지며, 가족이나 이웃이 함께 둘러앉아 반찬을 나누어 먹는다. 반찬의 가짓수와 구성에 따라 상차림의 격이 달라지고, 손님을 대접할 때도 반찬의 다양성은 곧 환대의 척도가 된다.
‘밥상머리’라는 말처럼,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 나누는 식사 풍경에는 정과 소통이 깃들어 있다. ‘반찬이 많아야 밥이 맛있다’는 말처럼, 음식의 다양성과 계절마다 달라지는 재료의 세심함은 우리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 있다.
한 상 가득 차려내는 풍성함은 단순한 과시가 아니라, 함께 먹고 나누는 데서 오는 기쁨이기도 하다. 반면 일본의 일상 식사는 ‘이치주산사이(一汁三菜)’라는 전통 방식이 중심이다.
이 상차림은 한 가지 국과 세 가지 반찬으로 구성되지만, 실제 식탁에는 밥, 국, 생선구이 한 점, 간단한 절임 정도로 간소한 경우가 많다. 각 음식은 작은 그릇에 담겨 1인분씩 개별적으로 제공되며, 덮밥, 우동, 소바처럼 한 그릇으로 한 끼를 해결하는 음식도 많다.
일본 식탁에서는 여러 사람이 음식을 함께 나누기보다는 각자의 몫을 조용히 음미하는 분위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소식 문화는 절제미를 미덕으로 삼는 일본 특유의 미학과도 맞닿아 있다. ‘하라하치분메(腹八分目, 배를 8할만 채운다)’라는 격언처럼, 적당히 먹고 남기지 않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자리잡았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음식의 구성이나 양을 넘어 식사를 대하는 사회적·문화적 태도에서 비롯된다.
한국의 ‘한상 차림’에는 함께 나누는 넉넉함과 가족, 이웃 간의 정이 담겨 있고, 식사 자체가 대화와 소통, 공동체 생활의 중심이 되어 왔다.
반면 일본의 밥상은 절제와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조용한 식사 태도를 보여준다. 조용히 자기 몫을 먹으며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일상화된 문화다. 물론 최근에는 이런 경계도 점점 흐려지고 있다.
바쁜 일상, 외식 문화의 발달, 1인 가구의 증가로 집밥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으며, 서로의 식습관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
한국에서도 건강을 중시하는 소식, 1인분 밥상에 익숙해지고, 일본 젊은이 사이에서는 친구와 음식을 나누거나 한국식 풍성한 식사 문화에 흥미를 느끼는 모습도 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 익숙했던 밥상머리의 온기와 가족이 함께 식사를 나누던 기억은 여전히 그리운 추억으로 남아있다. 밥상 차림, 반찬의 가짓수, 음식을 나누는 방식 속에는 그 나라의 정서와 생활 가치가 고스란히 스며 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오를 한 그릇, 그리고 그 밥상을 함께 할 이들에게 담긴 문화적 의미를 한 번쯤 떠올려보는 것도 뜻깊을 것이다.
밥상은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마음을 되돌아보게 하는 나의 삶의 거울이 된다.
오늘 저녁, 밥상 위에 어떤 음식을 올릴지,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와 마주 앉을지 잠시 떠올려보자.
어떤 이는 마음이 따뜻해 지기도 하고, 어떤 이는 묵직해 지기도 할 것이다. 여하튼, 그렇게 하루가 조금 더 단단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