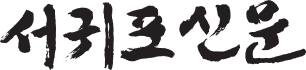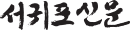안은주 / 사단법인 제주올레 대표

얼마 전 저녁 무렵이었다. 지인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요즘 새섬 가봤어? 지금 새섬 산책하러 나왔는데, 여기 꼴이 어떤지 알아? 도대체 새섬에 뭔 짓을 한 건지 모르겠네”하며 혀를 끌끌 찼다.
언론 기사를 검색해보니 서귀포시는 ‘야간 관광 활성화’를 내세우며 총 12억 원을 들여 약 1.2km 새섬 산책로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했단다.
며칠 뒤 저녁 일부러 시간을 내어 다른 지인 몇몇과 새섬을 찾았다. 광섬유를 활용한 터널형 미디어 파사드, 사슴과 토끼 모양 그리고 꽃 모양을 재현한 조명, 반딧불이와 유성우를 연출한 조명 등 구역마다 다양한 조명들이 새섬 전체에 설치되어 있었다. 일몰과 함께 켜지는 이 조명들은 많은 이들의 시선을 붙잡았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궁금했다. 한 무리의 관광객이 지나가면서 “와~”하고 박수치고는 “돈은 썼으나 이렇게까지?”라며 비웃었다. 동행한 지인들은 ‘밤에도 산책할 수 있도록 불을 밝힌 것은 좋지만, 스토리도 없고 심하게 이질적’이라는 평가였다.
“새섬에 토끼와 사슴은 왜? 저 토끼는 신서귀포 어싱광장에도 설치했던데, 특정 업체의 작업이라고 보면 지나친 음모론인가?”라며 뼈 있는 농담도 덧붙였다. 새섬의 야간조명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과유불급’인 것 같다.
새섬은 한때, 고요한 자연과 바람이 만들어내는 음색이 주인공이던 공간이었다. 걷는 이들은 달빛을 따라 나지막이 이어지는 길을 걸으며 스스로를 비워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지금의 새섬은 완전히 다른 성격의 공간이 되었다. 화려한 조명이 경쟁하듯 빛을 발하고, 인공적인 연출이 자연의 소리를 압도한다.
화려함이 무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새섬은 온몸으로 말하고 있다.
특히 미디어 파사드는 규모와 색감, 연출 방식 모두가 자연과 전혀 조화롭지 않다. 도심의 대형 건물 외벽 또는 대형 실내에서나 어울릴 법한 시각 효과가 제주 바다와 소나무숲을 배경으로 세워진 작은 섬에 비현실적으로 부착되어 있다. 동물 모형 조명 역시 마찬가지다. 아이들이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실내 체험관에서나 할 이야기다.
서귀포시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한다. 야간 관광 자원을 발굴해야 하고, 산책로 안전도 고려해야 하며, 밤에도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전략적 방향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 꼭 이래야 했을까? 새섬을 ‘테마공원처럼 꾸미는 것’이 야간 활성화의 유일한 답이었을까? 12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이 공간이 가진 고유한 가치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야간 관광지들을 살펴보면, 화려한 조명보다는 그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살린 곳들이 더 많다. 자연의 어둠 속에서 별을 관측하는 여행,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으로 은은하게 표현하는 라이트 페스티벌 등이 대표적이다.
‘더 밝고 화려하게’가 아니라 ‘더 의미 있고 조화롭게’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 이 정도로 파격적인 연출을 감행할 생각이었다면, 최소한 생태적 감수성을 지닌 예술가들과 협업해 자연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했어야 한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조명이 아니라, 자연과 어우러지는 빛, 걷는 이의 마음에 스며드는 빛을 고민했어야 한다.
사실 ‘야간 경관’이란 도시 디자인의 정점이다. 도시와 사람, 자연과 건축의 관계를 정제된 언어로 풀어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좋은 야간 경관은 공간의 맥락을 읽어내고, 그곳만의 이야기를 빛으로 풀어낸다. 지금 새섬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조명이나 더 큰 조형물이 아니라, 이 공간의 고요와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디자이너의 시선, 생태 예술가의 손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