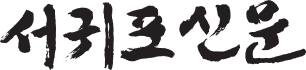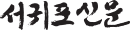[에세이로 쓰는 제주의 삶]
오금자 / 수필가

구름 사이로 황금빛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어둠을 밀어내는 붉은 빛이 바다와 하늘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더니 파도와 하나가 되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하늘에 떠오른 태양, 바람이 일으키는 파도의 소용돌이, 갈매기의 날갯짓 소리에 바다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
바다의 아침은 새로운 시작의 서약이다. 갯바위에 부서지는 파도가 하얀 포말을 만들어 낸다. 사면이 바다로 이뤄진 제주에서 바다는 땅과 더불어 가장 소중한 생계의 터전이다. 바다는 두 얼굴을 지닌 야누스와 같다.
폭풍우가 몰아치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하다가 아침이면 다시 평온한 얼굴로 생명을 품어낸다. 빨갛게 번져가는 하늘의 빛깔은 점점 더 진해지고 해녀들은 바다로 나갈 채비를 한다.
바다에서 삶을 일구어내는 ‘해녀(海女)’가 오늘도 파도와 싸워가며 희망을 건져 올리고 있다. 해녀의 고향인 제주도는 바람과 돌, 그리고 여자가 많아 예로부터 ‘삼다도(三多都)’라 불렸다. 여자는 많다는 것은 그만큼 생활력이 강한 여성이 많았다는 것이다.
해녀의 삶은 바다와 함께 시작하고 바다와 함께 마무리한다. 해녀들은 바다를 어머니처럼 여기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바다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보다 길다”라는 말처럼 바다에서 삶과 인내의 시간을 배워간다.
해녀들은 바다에서 얻은 해산물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바다와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이다.

▲바다와 해녀
가까운 바다 위에는 주황색 꽃의 향연이 수놓아져 있다. 주황색 ‘테왁’이 해녀의 숨비소리와 함께 물 위를 둥둥 떠다닌다. 물질을 하기 위해서는 테왁, 망사리, 물안경, 오리발이면 족했다. 수십 명이 해녀들이 두 발로 하늘을 차며 잠수했다가 올라올 때마다 주위에서는 ‘호오이~호오이~’하는 휘파람 소리가 들린다. 이 소리는 해녀들이 숨을 참았다가 한꺼번에 토해내는 숨비소리다. 해녀들은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수없이 자맥질을 반복한다.
자맥질로 지친 해녀를 물속에서 잠시 쉬게 하는 도구가 테왁이다.
제주도에서는 테왁 박새기라고도 부른다. 잘 여문 박의 씨를 파내고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구멍을 막았기 때문에 물에서 잘 뜬다. 테왁이라는 제주말은 ‘물에 뜬 바가지’라는 뜻이다. 이 태왁도 1960년대 중반기부터 스티로폼에 천을 입혀 만든 것이 나오면서 예전의 테왁은 자취를 감추었다.
테왁은 바다에서 작업하는 해녀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존재다. 조금만 방심하면 밀려오는 파도에 테왁이 저만큼 떠밀려 위험에 처한 때도 많다. 테왁은 단순한 부력 장치가 아니라 해녀들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삶의 동반자다. 테왁 하나에 의지한 채 몇 시간을 물속에서 버티어 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해녀들은 오랜 시간 바다를 누비면서 테왁에 의존해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든다.
할머니는 상군 해녀이다. 바다로 나가는 할머니 등 뒤로 짙은 햇살이 할머니의 그림자를 무겁게 드리운다. 오랜 세월 바닷속에서 살아온 삶이지만 요즘은 자꾸 힘겹다는 생각이 든다.
할머니가 바다에 들어가는 건 집안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가장의 책임도 있지만, 꼭 돈벌이 때문은 아니다.
바다에 대한 정 때문이다. 바다는 어머니의 가슴 같고, 살가운 피붙이 같아서 바다를 떠나서는 하루도 살 수가 없던 것이다.
해녀들에게 바다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지만 언제나 그리운 아득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다.
▲테왁에 기대 사는 해녀
할머니의 마음을 아는 듯 모르는 듯 파도는 저만치 물러났다 다시 돌아온다. 바다로 들어가는 것은 늘 죽음과 함께 하는 일이다. 할머니는 가루약을 한 줌 입에 털어 넣고 바다로 향한다.
몸에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약을 먹지 않고는 바다에 들어갈 수가 없다. 병원에서는 ‘숨병’에 걸려 더 이상 바다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한다. 바다는 자신의 가난한 삶을 이어가게 하는 생명의 젖줄이기에 테왁을 놓을 수가 없다.
바다는 종종 화난 짐승처럼 거칠어지기도 한다. 거친 바다에 숨을 참고 들어가 바다와 한 몸이 되어 전북을 따고 미역을 캐어야 밥을 먹을 수가 있었다. 해녀는 이승에서 저승의 삶을 바라본다. 물속에서 숨을 참고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다. 해녀들은 바다에서 삶과 죽음을 경험하지만, 그 속에서 희망과 그리움을 건져 올리며 자맥질한다.
해녀는 바다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물질을 한다. 식사도 거른 채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두세 시간씩 물속에서 보낸다. 해녀들은 테왁에 의지한 채 목숨을 걸고 일한다. 그들이 목숨을 담보로 하고 채취한 해산물은 바로 생명의 대가이다. 눈앞에 전복과 소라와 미역이 보이지만 욕심내지 않는다. ‘한 번만 더!’하는 욕심에 자맥질을 해대면 바다는 용서하지 않는다.
제주 바다에서 삶과 희망을 건져 올렸던 해녀들이 죽어가는 바다를 마주하고 있다. 죽어가는 바다를 바라보는 해녀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물질을 하며 희망을 건져 올렸던 시절을 기억하는 해녀들은 수확량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예전처럼 바다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 제주 바다에서 해조류가 빠르게 사라진다는 것은 바다 생명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다.

▲바다, 생명의 근원
해녀의 존재가치는 바다의 생태계를 보전하려는 노력에 달려있다. 바다가 존재하지 않으면 인간도 없어질 것이다. 바다는 인간 생존의 마지막 보고이다. 우리가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은 결국 우리를 죽이는 일이다.
황폐해진 바다를 바라보며 마지막 후회를 해봐도 이미 지나간 일이 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바다를 지켜야 한다. 바다의 환경 변화로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불안하지만, 해녀들은 절망에서 희망을 건져 올리려고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도 해녀들은 푸르른 바다를 유연하게 빠져나가는 인어가 되어 물속을 넘나든다. 망사리에는 어느새 소라, 성게, 전복 등이 가득 채워져 가고 해녀의 숨소리는 거칠어져만 간다.
한낮을 달구던 태양도 잠잠해졌다. 백사장에는 바다에 발을 담근 사람들이 하나둘 눈에 띈다. 바다는 우리에게 욕심을 버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해주는 것 같다.
멀리서 낯익은 해녀가 테왁을 허리춤에 끼고 걸어온다. 얼굴에는 소금꽃이 만발하게 피었다. 할머니의 모습이다.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대답은 메아리가 되어 허공 속에 부서진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오래된 이야기가 파도 소리 속으로 가라앉는다.
할머니의 뒷모습이 노을 진 바다에 일렁이며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