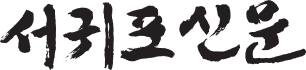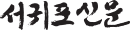윤봉택 / 시인, 삼소굴 시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보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러기에 사람은 문제에 봉착했을 때 지식인이 아닌, 선지식을 찾아 그 의문에 대한 현명한 대답을 구하고, 그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인공지능(AI)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고 한다고 하니, 참으로 세상 좋아졌다. 이렇게 해서 즉시 현답을 구할 수만 있다면야, 세상 어려울 게 무엇이겠나.
본시 생물체에는 인공으로는 갖출 수 없는 자연 지능이 존재한다. 아무리 컴퓨터 과학을 통하여 그 기능을 자연 지능에 맞게 접근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불확실한 인공지능일 뿐, 더 이상의 존재가 될 수가 없다.
자연 지능은 전기가 없어도 순환되지만, 그리고 그게 잘못된 정보인지 아닌지 등을 선별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우선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작동 자체가 아니 될뿐더러, 스스로 그 정보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능이 없다.
작업을 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그 편리함과 간결성을 위해 인공지능의 힘을 빌릴 수는 있어도, 그것을 확신하고 수용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얼마 전 한 문학인과 대화 중에 인공지능으로 시와 노래를 창작하여 봤는데, 너무나 좋았다고 했다. 누가 옆에서 얘기하면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AI를 통해 검색할 수가 있어 편리했다고 했다. 이 대화를 하면서 참으로 슬펐던 것은, 인공지능이 기계적으로 결합한 정보를 가지고 집합된 자료를 창작물로 인식하려는 듯한 그 자세였다. 결국 AI는 학습한 데이터 패턴을 기반으로 새로운 결과물을 얻는다 해도, 독창성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 않겠는가.
우리 사회에는 사람이 할 일과, 기계가 대신할 일이 구분되어 있다. 아무리 AI 지능이 좋다 하여도, 그 AI는 스스로 조작할 수가 없다. 그 조작의 명령을 하는 것은 오로지 사람뿐이다. 사람이 하지 않으면 AI는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AI를 통해 인간의 학습이나 지각 능력을 컴퓨터라는 과학의 힘을 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정답을 찾아가는 하나의 과학 기능의 컴퓨터 활용일 뿐, 인간의 생각이나 의식, 그리고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AI는 통계 과학이 만들어낸 하나의 산물이 아닌가. 따라서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서 사람의 일을 대신할 수는 있어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사람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AI는 시간의 신속성을 위한 하나의 물리적 장치라 볼 수가 있다.
물리적 관점에서 빛은 1초에 약 30만km를 이동한다고 한다. 따라서 물리적 상태에서는 이보다 더 빠른 속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공지능적으로 나타난 시간적 결과 추정일 뿐, 의식 세계에서는 시간이 아닌 공간적 사유가 가능하다. 초 단위보다 더 빠른 찰나라는 공간에서의 의식 활동은 거리 개념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일례를 들자면, 400광년 이상 먼 곳에 있는 북극성인 경우, 빛의 속도로 400년이 지나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지만, 사람은 찰나보다 더 짧은 순간에 그 존재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보고 듣고 맡고, 맛보고, 느끼는 기관만으로도,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능이 있는데, 하물며 의식 세계는 말해 무엇하랴.
AI가 실용적 측면에서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할 수는 있겠지만, 인간의 마음까지 앗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기계만 믿다가 기계에 다치면 허물이 깊다.
우리가 진정 바라는 세상은 삭막함으로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구조적 사회가 아니라, 마음과 의식, 그리고 생각이 자유로운 세상이 아닐까.
지금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 생각을 공유하며 지혜를 나누는 한마당 문화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