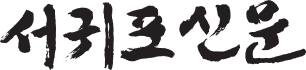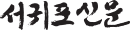<책읽는 서귀포, 칠십리 책방> 11. 제주어 서사시조집 '고람직이 들엄직이'
위미리 출신 저자 고정국 시인과의 대담
‘책읽는 서귀포, 칠십리 책방’에서는 ‘2011 서귀포시민의 책읽기’ 선정도서를 읽은 독자와 만나 대화를 나눈다. 이번 호에서는 2011 서귀포시민의책 선정도서 <고람직이 들엄직이>의 저자 고정국 씨를 만나보았다. 태풍 담레이가 지나간 날, 파도가 등대보다 높이 치는 모습을 보며, 남원에 위치한 서귀포시민의책 북카페에서 대담을 진행했다.
안재홍(서귀포시민의책읽기위원회 부위원장): 이번 대담은 서귀포시민의 책으로 선정된 도서 중에서 <고람직이 들엄직이> 저자와 함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됩니다.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어요?
고정국(시인, <고람직이 들엄직이> 저자): 저는 4.3사건이 일어나기 한 해 전에 위미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위미에서 보냈어요. 88년도에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이 되어 문단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은 가짜다>외 4권의 시집과 제주사투리 서사시조집 <지만울단 장쿨래기>, <고람직이 들엄직이>, 산문집 <고개숙인 날들의 기록> 등이 있습니다.

안재홍: <고람직이 들엄직이>에는 오래 전 제주의 모습이 그려져있는데요. 집필 배경을 말씀해주시겠어요?
고정국: <고람직이 들엄직이>는 제가 살아온 인생을 사투리로 기록한 것입니다. 제 고향 위미를 배경으로 당시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4.3으로 시작해서 네 살, 다섯 살 때, 벌거벗고, 멱감고, 고기낚던 모습을 위미사투리로 시조 형식에 맞추어서 적었습니다.
안재홍: 시와 시조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고정국: 시와 시조는 같은 운문이지만, 가장 노래에 가까운 게 시조예요. 시조라고 할 때 ‘시時’자가 ‘시간’의 개념이예요. 그 시대의 노래가 바로 시조예요. 시조를 쓰는 사람은 그 시대를 노래해야해요. 사람들이 형식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때 당시의 노래예요. 지금은 2012년, 이 시대의 노래가 있죠. 이것을 한국의 고유 형태에 맞춰서 노래하는 것이 시조예요. 이 시대의 아픔을 아름답게 풀어서 노래하는 것이 시조입니다.
안재홍: 이 책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조를 한 수 뽑아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정국:
감시룽 오물조쟁이-사람들은 익은 고추보다 풋고추를 더 좋아한다.
개맡디/물 봉봉 들민/옷 맨뜨글락/벗어그네
숨비멍/곤작사멍/또꼬냥/뺏쭉뺏쭉
감시룽/오물조쟁이/고조리가/돼베영
‘앞개(위미리 바다 이름)’에 밀물이 들면 옷 모두 벗어놓고
물 속으로 나뒹굴며 엉덩이 비쭉비쭉
까맣게 귀여운 고추 ‘고조리(늙은 누에)’가 돼 버려.
바다 이야기를 담은 거예요. 어머니 다음으로 나의 고추달린 알몸을 받아준 것은 바다죠. 1950년대 위미리 사람만 이 말을 알아요.
안재홍: 작품의 배경은 작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위미리를 배경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제주도가 다 아름답지만, 특히 고향 위미에 대한 자랑을 잠시 해주시겠어요?
고정국: ‘가장’이라는 최상급을 써서 위미 마을을 표현해볼게요. 시인이 가장 많이 배출된 마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포구를 가진 마을. 한라산이 가장 인자하게 보이는 마을. 지방 사투리 중에서도 의성어, 의태어가 가장 발달된 마을. 동박새, 휘파람새가 가장 아름답게 우는 마을. 감귤 맛이 가장 좋다고 소문난 마을이 위미리입니다. 제가 그전에 시드니에 갔어요. 시드니 한가운데 감옥이 하나 있는데, 그때 기행문에 ‘아름다운 것이 있는 곳에는 아픔이 있더라.’라고 썼습니다. 위미리가 아름답지만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을 이겨낸 마을’, ‘아픔을 견디고 이겨낸 마을은 아름답다.’ 이렇게 위미리를 자랑하고 싶어요.
안재홍: 제주어라기 보다는 ‘1950년대 위미사투리’라고 해야겠군요. ‘제주어’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주시겠어요?
고정국: 제주어란 말이 사실 규격에 안 맞는거예요. 서울어, 경상도어, 전라도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경상도 사투리라고 하지만,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의 사투리가 있죠. 제주도도 제주시와 서귀포가 다릅니다. 제주어는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이제 시작이죠. ‘제주어’라고 한다면 연구는 지금부터죠. 의성어, 의태어가 대단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위미리 사람들 다 시인이예요. 걷는 모습 하나 가지고도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각양각색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제주 의성어, 의태어예요. 이것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해요. 제주어에 대해 지금까지 정리해놓은 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알아줘야 합니다.

고정국: 시조 대중화, 시조 세계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노벨문학상을 시조로 받아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죠. 혹자는 고리타분하게 아직도 시조를 쓰냐고 합니다. 저는 반문합니다. 시조가 뭔지 아느냐. 우리나라 가곡 중에 시조가 얼마나 있는지 아느냐. ‘가고파, 성불사의 밤, 옛동산에 올라, 봄처녀’ 전부 시조인데, 노래를 부르면서도 시조인 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성악을 봐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시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시조 보급을 위해서 ‘월간 시조갤러리’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처음이예요.
안재홍: 글쓰기 수업을 여러 곳에서 하고 계신데, 주된 수업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고정국: ‘저비용의 행복론’ 방법이 글쓰기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쓰려면 무본務本부터 해야합니다. ‘바탕을 갖춰라.’ 바탕을 갖추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읽어야합니다. ‘자연을 읽어라. 고전을 읽어라. 세상을 읽어라. 나를 읽어라.’ 이 네 가지를 골고루 섭취해야합니다. 그 다음은 필독서를 정해야합니다. 좋은 책을 정해 한 가족이 전부 필독해야합니다. 이것을 읽은 가족의 십 년 후와 읽지 않은 가족의 십년 후를 비교해보면, 상상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안재홍: 한 집안에서 모두 그 책을 읽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정국: 책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째 읽어야 그것을 안다고 할 수 있죠. 일반인은 스무 권, 작가가 되려면 백 권을 정해야합니다. 다시 한 번 읽어야겠다고 생각되는 책을 정하는 거예요. 지식을 읽어서 머리에 저장하는 사람이 있고, 가슴에 저장하는 사람이 있고, 온몸에 저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글쓰는 사람은 육화肉化시켜야합니다. 머릿속에 저장만하려고 하지 말고 실천해야겠죠. 지식에서 지성으로 지혜로 실천으로 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글쓰기가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재홍: 서귀포 시민의 책읽기에 대해 의견을 주신다면?
고정국: 서귀포시민만이 아닌 전국민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하라. 함께 하라. 새롭게 하라. 진실되게 하라. 신비롭게 하라.’ 이 다섯 가지를 갖추라고 하고 싶습니다. 책읽기도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짜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딱딱한 책이나 어려운 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재홍: 나에게 책이란?
고정국: 책이란 “스승, 친구, 사람”입니다. 저는 도서관 앞에 지나치게 되면 고개를 숙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집합되어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앞에 지날 때 고개를 숙여야죠.(웃음) 책은 곧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인연은 악연이 될 경우도 많지만, 책과의 인연은 악연이 없어요. 이것이 책을 늘 가까이 해도 되는 이유입니다. 책은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사진·정리 최선경 서귀포시민의책읽기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