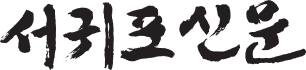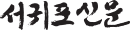<기획> 추억과 낭만, 그리운 솔동산(하)
| 솔동산길은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 서귀포의 명동이라고 불릴 만큼 번화가 였다. 하지만 그 이후 도시정비와 신도시 건설 등의 영향으로 쇠퇴하면서 옛 모습이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신문은 2회에 걸쳐 시민과 지역주민들의 기억을 통해 옛 도심이었던 솔동산길의 흔적을 더듬고 옛 문화가치의 중요성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
"이중섭거리를 옛날엔 알자리 동산길이라고 불리웠지."
서귀포 향토사학자 박정석(70)씨는 8일 이중섭거리의 경사진 오르막길을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 이중섭거리 입구에서부터 오르막길을 오르던 그는 옛 아카데미 극장 앞에 멈춰서 다시 말을 이어갔다.
"극장 바로 옆에 살았던 김 씨 할아버지의 별명에서 따온 거라고 전해지고 있어. 할아버지는 자리젓을 담근 알밴 자리의 꼬리 부분을 왼손으로 잡아서 밥 한술 뜨고 손에 묻은 국물을 쪽쪽 팔아먹으며 자리 한 마리로 한 끼 식사를 했다고 해. 일종의 조냥정신이지. 이같이 절약하며 부자가 된 할아버지의 별명이 거리의 이름으로 불렸다고 하네."
그는 바다 쪽을 바라보며 다시금 말을 이었다. "이렇게 알자리 동산에 오르면 솔동산 마을이랑 서귀포 앞바다가 한 눈에 펼쳐졌지. 지금은 높은 건물이 들어서서 예전처럼 볼 수는 없지"라며 아쉬워했다.
▶ 거북바위에 축원 올리면 부자가 된다?
솔동산길 입구인 현 태평로 서귀포수협 사거리 일대는 말을 키우던 목장지대였다고 한다. 바로 밑으로는 소나무밭이 있었다고 한다. 소나무밭에는 거북바위에 축원을 올리는 거북용신당이 있었다고 한다. 거북바위에 제를 지내면 부자가 된다고 해서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았다고 한다.
거북용신당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서귀진성이 자리해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때 일본인들이 솔동산에 도로를 내고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훼손돼 지금은 이전 모습을 찾기가 어렵다.

서귀진은 당초 홍로천 위에 있었으나 조선 선조 23년(1590) 현재 위치(서귀포초등학교 서쪽, 서귀진성 문화재지구)로 옮겨 축성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규모는 주위 251m, 높이 3.6m에 이르는 진성으로 알려졌다.
1920년대 한일합방 시기까지 기와 건물 3동과 성담이 남아 있어 당시 일본군의 관청으로 사용되다 4 3사건이 발생하자 이곳의 성담을 헐어 마을을 방어하는 축성용으로 썼다. 이후에는 주거용 건축 용도와 밧담으로 무분별하게 훼손돼 지금은 당시의 성담이었던 담들이 우잣담과 성굽담으로 일부 남아 있다. 이 자리에는 서귀포경찰서, 서귀여중고등학교도 자리했었다.
맞은편 터에는 1930년대 일본이 토지와 자원을 수탈할 목적으로 설치한 동양척식주식회사 서귀포지점이 들어섰다. 그러면서 솔동산 곳곳에 일본인이 운영하는 통조림공장, 전분공장, 소라전복껍질로 만드는 단추공장이 하나둘씩 생겨났다.
현 서귀포초등학교는 1920년 서귀공립보통학교란 이름으로 처음 설립됐다. 학교 바로 뒤에는 서귀면사무소가 들어섰다. 이후 서귀읍사무소, 서귀포시청이 들어섰고 현재 서귀포자치경찰대 청사로 사용하고 있다.
▶ 유현목.차정남 감독이 솔동산에 머물다?
당시 장춘여관이라는 유명한 숙박시설이 있었다. 1967년 서귀포에서 처음으로 영화촬영이 이뤄졌다고 한다. 영화제목은 나뭇꾼과 선녀. 유현목 영화감독과 차정남 조명감독이 이 장춘여관이 머물며 정방폭포의 절벽을 타고 내려가서 영화를 찍었다고 한다.
장춘여관에서 골목길로 나오면 대호다방이 있었는데 이 곳에서 차를 마시며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같은해 12월 25일부터 30일부터 대호다방에서 시화전을 열었던 박정석씨는 당시 유현목 감독과 차정남 조명감독을 만나 차도 마시고 술 한잔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1970년대 516도로가 생기면서 12인승 마이크로버스가 서귀포에 다니면서 솔동산 입구에 마이크로 버스정류장이 만들어졌다. 버스정류장 옆에는 정미소도 있었다.
해방 후에도 담배배급서(현 이중섭거리 입구)가 있어 당시 담배를 재배한 사람들에게 담배봉초를 나눠줬으며, 담배봉초를 받은 사람들은 누런 종이에 넣어 돌돌 말아 사용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