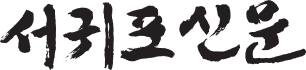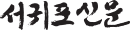서귀포시는 한때 살기 좋은 도시라는 평가를 받았었다. 2013년 서울신문과 연세대학교가 공동 주관한 평가에서는 ‘전국 인구 25만 도시 중 가장 살기 좋은 지역’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4년에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지방자치 경쟁력 지수에서 경영성과 부문 1위, 한국경제신문과 한국외국어대학교가 발표한 지방 브랜드 경쟁력 지수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서귀포시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미 2021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전환됐다. 현재는 전체 인구 대비 24%가 조금 넘는다.
서귀포시는 고령인구는 증가추세지만, 청년인구는 감소세인 도시다. 청년이 떠나고, 청년이 돌아오지 않는 도시는 ‘인구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도시기도 하다.
서귀포는 대학이 없는 도시다. 대학뿐만 아니라, 청년이 찾는 일자리도 넉넉한 편은 아니란 게 중론이다. 대학은 단순히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와 산업을 연결하는 지식의 플랫폼이자 혁신의 거점이 될 수 있다.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고, 연구를 통해 지역 산업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공간이다.
국립대학교인 제주대학교는 과거 서귀포 지역과 깊은 인연을 맺었다. 과거 서귀포에는 제주대학교의 농과대학 및 수산학부가 운영되며, 지역 농업·수산업 발전에 직접 이바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기반이 사라졌다. 서귀포시 하원동에 있었던 옛 탐라대학교도 사라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서귀포 지역에서 옛 탐라대학교 터에 조성 중인 한화제주우주센터 등 우주산업 분야에서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다.
서귀포에 대학은 없지만, 국립대학교 제주대학과 제주도, 정부 등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우선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다. 송석언 전 제주대학교 총장은 지난 20일 서귀포시청에서 열린 ‘2025 서귀포시 경제포럼’에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RISE 사업과 글로컬 사업 등 대학과 연계하는 방안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유치가 장기 과제라면,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송석언 전 제주대 총장의 제안처럼 라이즈 사업과 글로컬 사업을 활용해 런케이션 등에 관심두고 추진하는 것이다. 송 전 총장은 “청년 일자리가 없으니 일자리 찾아 이탈하고 청년이 없으니,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서귀포시 인구 감소 대책은 청년층을 서귀포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모르는 바가 아닐 것이다. 알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속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전했다. ‘살기 좋은 도시’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서귀포 지역 사회가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