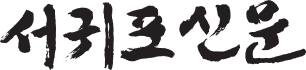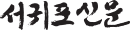제18호 태풍 차바는 새벽의 제주섬을 급습, 강타했다. 적도 인근에서 발생했을 때만 해도 그 진로에 대해 올여름 여느 태풍들처럼 일본열도 쪽으로 방향을 틀어 이동할 것으로 예측됐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한반도쪽으로 치고 올라와 급기야 제주에 큰 생채기를 남겼다. 9년 전인 2007년 9월 17일, 낮 시간대에 내습해 큰 피해가 발생했던 나리와 비슷한 이동 경로였다. 하지만 태풍 차바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제주를 관통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피해가 제주 전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만 가구에 이르는 정전 피해를 비롯해서 단수, 하천 범람, 도로 및 농경지, 주택 침수 피해, 어선 전복, 노형동과 대륜동 신시가지 신축 공사장의 크레인 전도, 공사장 곳곳 펜스들이 누더기화하는 피해도 잇따랐다.
태풍 차바가 동반한 폭우는 윗세오름 624.5mm, 어리목 516.0㎜, 삼각봉 455㎜ 등 한라산에 기록한 강수량이 말해 주는 것처럼 새벽 시간에 시간당 171.5mm 이상 되는 물폭탄을 쏟아 부었다. 지역별 수치를 보면, 제주시는 동지역 175.1mm, 용강 385㎜, 유수암 315㎜, 김녕 230.5mm, 한림 127.5㎜, 고산 26.6mm 등이다. 서귀포시는 동지역에 288.9mm, 남원 183mm, 안덕124mm, 표선 115mm, 성산 141.6mm, 대정 90mm 등이다. 이와 같은 집중 호우는 하천 범람을 일으키는 한편 도로 침수, 농경지 침수 등으로 이어졌다. 한천 범람으로 흡사 나리 태풍 때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제주시 용담동 주민들은 새벽 주민대피령에 따라 주민들이 황급하게 움직이는 등 공포에 떠는 밤을 지내야 했다. 또 인근에 주차되었던 차량 수십 대가 물에 휩쓸리면서 뒤엉키는 피해도 있었다.
35m/s 내외로 예보됐던 바람의 세기는 제주시 건입동에서 47m/s, 고산지역에서는 56m/s 를 넘는 순간 최대풍속이 관측되기도 했다. 예상보다 더 강했던 바람으로 인해 가로수와 전신주 등이 수없이 쓰러지면서 정전이 발생, 더욱 큰 피해를 불러왔다. 서귀포시 중문동, 법환동, 하원동 일대를 비롯해 많은 지역의 정전 사태는 5일 오후 늦게까지도 복구되지 않으면서 더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 대비가 소홀했다. 늑장 대응이 문제였다.
제주도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간 4일 오후 4시에야 부랴부랴 권영수 행정부지사 주재로 협업부서, 유관기관 합동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분야별 대비상황을 점검하면서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재난대응체계를 가동했다는 제주도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상황 발생에 따라 어떤 대응을 했는지 아리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 각 실국장과 행정시, 제주기상청, 해병9여단,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한전, KT 등 50여명이 참석했었다면 모든 대응이 연계되어야 했다. 그럼에도 대응을 잘못한 것인지, 체계상 착오가 발생했던 것인지 피해는 예상 외로 더욱 커지고 말았다.
아직 제18호 태풍 차바에 의한 피해 내역이 전체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체가 드러나려면 앞으로 10일간의 신고 기간이 지나야 한다. 정전 피해로 인한 하우스 시설, 양어장, 축산 시설 등의 피해까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제보에 의하면 그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5만호 내외 정전사태로 인한 피해는 5일 오후 늦게까지 1만 가구 넘게 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 피해가 어떻게 나타날지 아직 예측불허이다. 5일 오후 6시 현재 서귀포시 210건, 제주시 140건 등 제주도 전체적으로 35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물론, 제18호 태풍 차바에 의해 발생한 피해 역시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적 요소가 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느때의 재난처럼 인재라는 비판이 나온다. 예보의 잘잘못을 떠나 그동안 행정의 방재 정책은 물론이고 정책 실천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왔다는 지적이다.
수방 공사 현장 곳곳을 돌아보면 엉터리로 이뤄진 곳이 부지기수이다. 하천방재벽 공사는 다시 무너지길 바라는 형태로 이뤄진 곳도 많았다. 종남천 하구 공사처럼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공사현장도 곳곳에서 눈에 띈다. 신축 공사장 펜스들의 경우 강풍에 날아가고 종잇장처럼 구겨진 현상이 빈발하고 있었다. 이는 공사장마다 제대로 된 펜스 설치라기보다 형식적으로 '눈삐약' 비규격품 사용이 빚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리부서의 평소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현장 중심으로 대책을 세우고 평소에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다면 재난에 닥쳐 우왕좌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공직자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숙지할 수 있는 체계화된 매뉴얼을 갖춰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7년전 태풍 나리 때의 피해 상황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도 행정은 반성함이 마땅하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엄격하게 다루고 사소한 실수, 잘못도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태풍 피해에 대해 동원 가능한 인력, 장비 등을 현장에 투입해 복구에 신속하게 나설 계획이라고 했으니 제대로 된 그 실천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