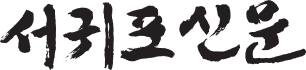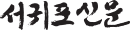제주 하논은 국내 유일의 마르(Maar)형 분화구로, 수만 년 전 지하수와 마그마가 만나 폭발한 수성화산 활동의 결과물이다. 분화구 바닥이 지표면보다 낮은 독특한 구조를 지녔다. 수성화산인 성산일출봉, 송악산, 수월봉과는 다른 지형학적 특징을 보여준다.
하논은 수만 년 전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꽃가루, 황사 등 퇴적물이 켜켜이 쌓이며 고환경 정보를 보존하고 있다. 하논 지하에서 1만2000년 전 식물의 꽃가루 등이 발견됐다고 한다. 이는 당시 기후와 생태를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단서가 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로 인해 하논은 ‘타임캡슐’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처럼 하논은 지질학적, 생태학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공간이다. 제주도가 최근 공고한 ‘하논분화구 핵심구역 사유지 매입계획’은 그 보전을 위한 실질적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2033년까지 하논 핵심구역 내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해 보전과 활용의 균형을 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논 복원과 보전 논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03년 서귀포시가 생태숲 복원사업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며 계획을 공식화한 이후 여러 차례 복원 시도가 있었다. 당시 천지연폭포-걸매생태공원-하논을 잇는 생태관광벨트 구상이 나왔지만, 국비 확보 실패 등으로 사업 추진이 무산됐다.
이후 시민사회의 공론화 움직임과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의 복원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예산과 주민 반발 등으로 번번이 좌초돼왔다.
하논분화구는 전체 면적이 사유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막대한 사유지 매입 비용과 토지주 반발, 명확하지 않은 복원 방향성 등이 복원 사업을 수차례 가로막았다. 그러는 사이 하논은 논과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영농 활동은 불가피하게 하논분화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계획만 반복되고 사업은 진척이 없다보니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까지 흔들려온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하논 복원을 과거로 되돌리는 ‘호수’ 재현 개념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 일부 전문가는 하논이 과거 호수였다는 기록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호수로 복원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사회적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복원이란 명분을 앞세워 또 다른 개발로 이어지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제주도가 수립한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은 방향 설정에서 균형을 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핵심 생태 가치는 복원하되, 지역과 주민의 삶과 역사, 현재의 토지 활용 현실까지 고려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하논의 보전과 현명한 활용은 단지 자연을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을 지키는 일이며 지역의 생태적 자존감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선 지역 주민과 토지주의 동의와 참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행정도 이번만큼은 말뿐인 계획이 아니라, 일관된 실행과 설득으로 진정한 ‘복원의 출발점’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