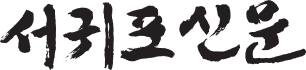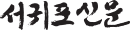오충윤 / 에밀 타케 생태영성연구소 대표

제주의 가을은 올레길을 걷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다. 만화 같은 둥근 구름이 뭉개거리고 노랗게 익어가는 과수원 돌담을 지나면, 이름 모를 보랏빛 들꽃들이 자잘하게 피어 있는 바닷가 올레길이 펼쳐진다.
이 길은 아무 약속 없이 홀로 걸을 수 있는 길, 멀리 태평양에서 밀려오는 짙은 소금 내음이 청아한 은목서(銀木犀)향과 어우러져 코끝에 닿는다. 한낮의 햇살 아래 드문드문 서 있는 해송 그늘은 고요하고, 나그네의 무심한 발걸음에는 서두름이 없다. 가을 바다는 그렇게 사람을 품어 안으며, 마음속 묵은 기억 하나를 슬며시 꺼내 준다.
서귀포 보목동 바닷가를 지나는 올레 6코스에는 전설 같은 이름 ‘검은여 바당’이 있다. ‘여’는 평소 바다에 잠겨 있는 큰 바위를 뜻하는 제주어다.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검은여는 예전엔 해녀들이 숨을 나누고 물질하기 좋은 바다였다. 울퉁불퉁한 바위마다 미역과 몰망, 누런 감태같은 갈색 해조류들로 해양 숲을 이루었고, 그 속을 헤엄치는 어랭이와 객주리들이 뒤섞여 생명의 노래를 이루었다.
검은여는 그야말로 광활한 바다의 소중한 작은 목장이었다.
나에게 바다는 어릴 적 놀이터였다. 그 시절 아이들은 파도를 넘으며 헤엄을 배웠고, 검정 타이어 튜브로 자맥질하며 물고기와 친구가 되었다.
해녀들의 ‘호오이~ 호오이~’ 숨비소리가 아스라이 들려오던 시절, 제주의 바다는 늘 청정했고 풍요로웠다. 이렇듯 거센 파도를 막아주는 검은여 바위는 해녀 누님들의 삶터이자 동네 삼춘의 낚시터가 되었다. 언제나 바다는 말없이 반짝이는 푸른 무대였으며, 어린 날의 추억이 눈부시게 빛나던 곳이었다.
그러나 반세기가 흐른 오늘, 그 검은여 바다를 다시 마주했을 때 나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바닷가의 듬성듬성 흩어진 현무암은 여전히 제자리였지만, 바닷속 푸른 속살은 이미 생기를 잃어 색이 바래버렸다. 매생이도, 파래도 사라진 바다는 더 이상 살아 있는 바다가 아니다.
해조류들이 고사해 버린 검은 돌들은 갯녹음 현상으로 하얗게 변해 있고, 바다 밑은 모래사막처럼 생명을 잃어가고 있었다. 많은 종류의 해양 어류들이 숨바꼭질하던 적갈색 해조류 목장이 사라진 바다는 생태계가 무너진 채 침묵하고 있다.
육지에 식물이 있듯, 바다에는 해조류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육상 식물만큼 바다의 수중생물에는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 ‘제주고사리삼’이나 ‘한라솜다리’의 멸종 위기를 걱정하면서도, 사라져가는 검은여 바다의 미역이나 감태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다. 예전에 지구상의 생명체를 동물과 식물로 구분했을 때 바다의 해조류를 식물로 분류했듯, 바다의 식물 또한 우리 공동의 집 지구를 구성하는 소중한 생명체임에도 인간들이 무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럴 때면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바로 ‘한국 식물의 개척자’로 불렸던 에밀 타케 신부다.
그는 1900년대 초 서귀포 홍로성당에 재임하면서 제주도 곳곳을 다니며 1만여 점이 넘는 식물을 채집하고 기록했다. 그는 우리나라 개화기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제주 식물의 가치를 밝혀낸 참된 선각자였다. 그러나 그의 방대한 표본 가운데에도 해양식물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당시에는 바다에 들어가 해조류를 채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 에밀 타케가 해조류 표본을 남겨 두었다면, 지금 우리는 사라져 버린 바다를 그 기록을 통해 다시 만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잠시 이런 생각을 해 본다. 누군가 지금이라도 검은여 바다의 해조류는 물론 소라와 오분자기까지 모두 모아 표본으로 기록해 둔다면, 먼 훗날 그것은 또 다른 서귀포 바다의 기억이 되지 않을까. 100년 전 에밀 타케가 식물표본으로 제주 자연의 가치를 남겼듯, 지금 우리에게는 무너져 가는 바다의 생명을 지키려는 해양 생태계의 아카이브(archive) 기록관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오늘도 바다는 늘 그 자리에 있다. 올레길을 걷다 검은여 앞에 서면, 파도는 여전히 철렁이지만 바다 밑 생명은 침묵하고 있다. 기후 위기의 시대, 바다는 더 이상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그 안의 생명은 인간의 손끝에 달려 있다. 우리가 누려온 이 바다는 미래 세대에게 물려 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기에, 어린 시절 풍요로웠던 제주 바다로 되돌아가야 한다.
다시 검푸른 생명의 숲으로 바다를 되살리는 일,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삶의 방식일 것이다. 바다의 회복은 결국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기에 ‘검은여 바당’에서 생명의 빛이 다시 희망처럼 출렁이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