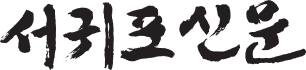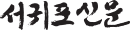강호남 / 도시공학박사

“내 주치의는 내가 이 직책을 최소한 1년, 어쩌면 2년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해 주었습니다”
1949년 9월 15일 제2차세계대전 주범국 독일의 서방 수상직을 수락하며 아데나워는 말했다. 그러나 그는 14년간 그 자리를 지키며 서독을 패전국에서 부강한 나라로 부상시켰다. 그의 인기는 한 동안 철혈재상 비스마르크를 능가할 정도였다.
제2차 세계대전은 근대와 현대를 극명하게 가르는 대사건이었다.
종전 이후 약 10년간 세계질서는 급변했고 그 시기 정착된 질서는 현대 세계정치지형의 근간이 되었다. 당시 등장한 정치지도자들은 자의든 타의든 자기 나라와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들이 되었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영국의 윈스턴 처칠,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 프랑스의 샤를 드골, 유고슬라비아의 티토로 알려진 요시프 브로즈, 스페인의 프란시스코 프랑코, 이집트의 무함마딘 나기르와 그를 이은 가말 압델 나세르, 인도의 자와할랄 네루, 중국의 마오쩌뚱과 대만의 장제스,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 한국의 이승만까지가 그렇다.
이들 대부분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다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평가를 받는 가운데 서독을 일으킨 콘라트 아데나워는 유럽사에서 더욱 눈에 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혼돈 속 유럽에 대한 미래 방향을 결정한 것은 다름 아닌 그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소 과장이지만 그의 행적과 사상, 전후 활동을 살펴보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그는 서방 자유세계의 장벽이 되었다. 그는 통일 독일의 기회보다도 공산주의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 노선을 걸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그 결과, 독일은 스탈린 치하의 동독과 서방연합의 통치를 받는 서독으로 분리되었다.
아데나워는 1876년에 쾰른에서 태어났다. 법대 졸업 후 쾰른 법정에서 일했다. 30세가 되었을 때 주변 권유로 정당 조직인 첸트룸에 가입, 쾰른시 시의원이 되었고 3년 후 부시장이 된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식량 공급을 잘 해결한 공로로 1917년 프로이센에서 최연소 시장으로 당선된다. 그는 나치 집권 직후인 1933년 3월까지 쾰른 시장으로 재직했다. 2차대전 직후 연합군 지도자들이 아데나워를 다시 쾰른 시장 자리로 복귀시켰다.
아데나워는 1946년 3월 영국점령지 내의 기독교민주연합당의 지도자가 되었고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이 창건되었을 때 수상이 될 길을 맞이한다.
이때부터 그는 자기가 추구해야 할 노선을 분명히 하였다.
그는 당장 독일에게 필요한 것은 통일과 영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연방공화국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며, 민주적이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를 세우는 일이었다. 국내 반대도 만만치 않았지만 직접적 위협은 소련이었다.
이웃나라 프랑스와의 오랜 악연도 큰 장애물이었지만 아데나워는 드골에 대한 개인적 친밀감과 그의 정책에 대한 동조로 극복하려 노력했다.
그는 소련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원래 싫어했으며, 나치의 경험에서 배운 지나친 민족주의는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독일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잃을 수는 없었다. 또한 미국 중심의 서방세계와의 연합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구축한 국가 정체성 안에서 차기 총리가 된 경제장관 루트비히 에르하르트의 활약에 힘입어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나 아데나워에게도 짙은 시련이 있었다. ‘진실, 자유, 법치’를 주장하던 그는 13년이나 나치의 탄압에 시달려야 했다.
그의 나이 57세 때부터다. 이미 독일 대도시의 시장직을 오래 지낸 신분이었으나 소득과 연금이 중단됐고 거주지도 빼앗겨 생계에 곤란을 겪었다.
나치 과격분자들은 아데나워 암살 의사를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그는 심한 감시에 시달리다가 두 차례나 체포되었다. 결국 첫째 아내 사별 후 얻은 둘째 아내 구시마저 감옥에서 얻은 병으로 1948년에 죽었다.
그는 반나치 투사는 아니었으나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은 대가로 정계에 복귀하여 진정한 활동을 하기까지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다.
“가시 속에서 핀 꽃이 더 아름답습니다”
대만의 해변가에 핀 선인장 꽃을 바라보며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말했다.
그렇다. 시련 속에서 핀 꽃이 더 아름다운 법이다. 시련 속에서 더 아름답고 고귀한 가치가 탄생하는 것이 삼라만상의 이치인가 보다.